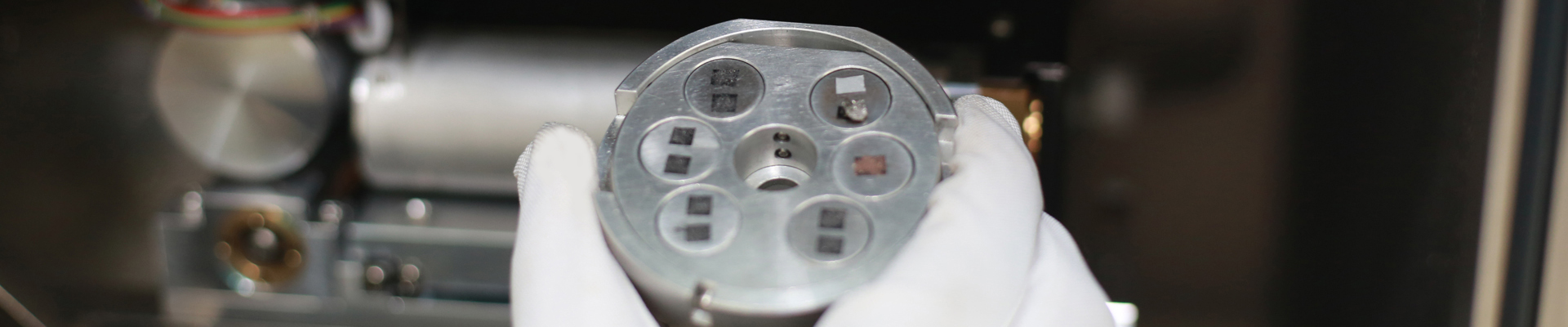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시서화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는데 이 말은 서예, 그림, 시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서예와 그림, 시에 유능한 사람들을 서화가 또는 《삼절》로 불러왔다.
고려시기의 문인 리인로(1152-1220)는 서예와 그림, 시에 유능한 《삼절》로 명성이 높았다.
민족고전 《근역서화징》에는 고려시기의 문인 리인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하였다.
《자는 미수이고 호는 쌍명재이다. 명종10년 경자년(1180)에 과거에 급제하여 비서감벼슬을 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파한집>이 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령리하여 글을 잘 지었고 초서와 예서를 잘 썼으며 안치민에게서 그림을 배워 그림도 잘 그렸다.》
리인로가 18살나던 해인 경인년(1170) 8월 30일 고려에서는 문관들을 반대하는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이 정변을 계기로 고려의 수많은 문관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고 다행히 살아남은 문관이나 그들의 가족들은 사방으로 뿔뿔히 흩어졌다.
집에 앉아 글공부를 하고있던 홍안의 나이인 리인로는 이 소식을 듣고 부모들과 헤여져서 깊은 산속에 있는 절간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였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리인로가 절간에 들어온지도 5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이였다. 그동안 절간에 숨어서 글공부만 하고있던 리인로에게 속세에 시주를 받으러 나갔던 중이 찾아와 나라에서 문인들에게도 과거시험을 치게 하였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 소식을 들은 리인로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버들고리안에서 종이와 먹을 꺼내서 벼루에 먹을 갈면서 그동안 머리속에 익혀두었던 시구절을 생각하였다.
리인로는 이렇게 써나갔다.
내 일찍 하늘문을 두드려
은하수를 끌어내려
이 세상 더러운것들
말끔히 씻어버리자 하였더니
지나치게 큰 나의 뜻을
한번도 펴보지 못했어라
그 몇해동안 숨죽이고
잠결에도 기다렸네
나의 가야금소리
한평생 알아주는 사람 없고
짐승처럼 포악한 무리들
무찔러 없애는 사람도 없었네
갈길험해라
내 노래 슬퍼라
칼집에 든 두자루의 칼은
분하여 떨며 울기만 하노라
초서체로 써나가는 리인로의 필체는 금방이라도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듯하였다.
또다시 세월은 흘러 그가 절간에 들어온지 8년이 되는 여름 어느날 리인로는 중들의 바래움을 받으면서 속세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리인로는 여가시간에 그림공부도 하였다.
그가 그림그리기를 시작한지 몇달이 되는 어느날 리인로의 4촌형인 리당두가 그의 집에 왔다가 리인로의 책상앞에 놓여있는 참대그림을 보고 자기가 병풍에 붙일 종이를 가져올테니 거기에 참대를 그려달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리인로는 4촌형인 당두가 가져온 병풍종이 네폭을 가로질러 한줄기의 참대를 그리고 드문드문 잎을 그려넣었다. 리당두는 그 병풍을 집에 세워놓았다. 후날 리당두의 집에 들렸던 어떤 화가는 병풍에 그린 참대를 보면서 이 그림은 보통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고 찬탄하였다.
그후 리인로는 비서감벼슬에까지 올랐고 처지와 비슷한 문인들과 뜻을 모아 《해좌칠현》이라는 시회를 묻고 시짓기와 그림그리기를 하면서 살다가 69살의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이처럼 리인로는 고려시기 시서화에 유능한 《삼절》의 한사람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