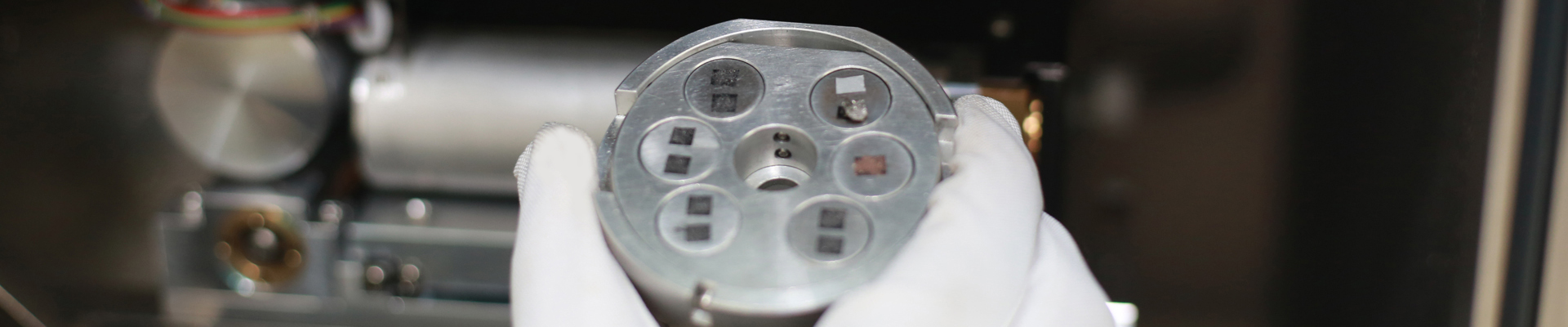
《
항일의 녀성영웅
해방후
주체35(1946)년 여름 장마철이였다.
한 녀성이 밥을 지으려는데 불이 잘 붙지 않고 아궁이에서 연기가 거꾸로 나와 애를 먹다보니 땔나무에 누기가 차서 제때에 식사를 보장하기가 참 힘들다고 안타까운 소리를 한적이 있었다.
《지금같은 조건에서는 아무 타발도 하지 말아요. 우리는 산에서 내내 젖은 나무로 불을 땠는데 그 요령을 알고 때면 불을 살릴수 있어요. 그러나 산에서는 나무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밥을 짓는 그자체가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적들이 계속 덤벼들어 전투를 하는 속에서도 식사보장을 해야 하고 때로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내려고 미친듯이 돌아칠 때에도 밥을 지어야 하였습니다.》
그때
어느날 소부대는 적《토벌》대가 뒤따르리라는것을 예견하고 무연한 벌방지대를 하루밤사이에 행군해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정황이 생겨 날밝기 전에 벌방지대를 통과할수 없게 되였다. 소부대는 부득불 행군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벌방지대이다보니 몸 하나 변변히 숨길만 한 곳도 없었던것이다. 대원들은 마른풀로 온몸을 위장하고 웅뎅이들에 감쪽같이 매복하였다.
유격대의 행방을 놓친 적들은 이른아침부터 비행기를 띄우고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벌판이다보니 자칫하면 적들의 비행기에 발각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적비행기가 어찌나 낮추 떠서 피눈이 되여 유격대를 찾았던지
놈들은 이렇게 찾아보고 다른데로 가는것이 아니라 계속 그 벌판우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마도 분명 거기에 있음직한데 찾아내지 못하니 기어이 더 들춰보려는 심산같았다.
하늘에서는 적들이 날뛰지만 그렇다고
시시각각 위험이 뒤따르는 때에 밥을 짓는다는것은 결코 생각처럼 쉬운것은 아니였다.
공중에서는 비행기가 떠돌아치니 불도 피울수 없지, 물도 없지, 이런 조건에서 밥을 짓는다는것은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다.
어떻게 하면 적들이 기미를 채지 못하게 밥을 짓겠는가.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골짜기를 따라가며 살피시는 과정에 약간한 물이 고여있는것을 발견하시였다. 뾰족한 돌로 얼마쯤 파보니 원천이 가늘뿐이지 물줄기였다.
실오리처럼 솟아오르는 물을 한고뿌 두고뿌 떠서 한소랭이 장만하시였다.
이제는 나무가 문제였다. 골짜기에는 나무가 없었다. 부득불 야산에 올라야만 하였다.
버드나무, 아카시아, 물개암나무들이 연기가 적게 나기때문에 그 삭정이들을 한아름 되게 거두워들이시였다. 그리고는 그것들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시였다. 마른 나무라 해도 껍질이 있으면 연기가 조금이라도 나기때문이였다.
그 나무로 은페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웅뎅이에 불을 피우시였다.
적비행기가 가까이에 와서 기체를 기우뚱거릴 때에는 움직이지 않고있다가 한바퀴 도느라 멀어질 때에 날래게 행동하면서 쌀을 씻어안치고 불을 지피시였다.
밥을 안치신 다음에는 약간씩 나는 연기마저 공중에서 알릴가봐 줄창 수건으로 흩날려버리시였다.
이 모든 일을 어찌나 신속하고 은밀히 하시였는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돌가마아궁에 나무가지를 넣고는 연기가 피여나지 않는가, 불길이 보이지 않는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약간한 외오리 연기라도 피여날것 같으면 연기낼수 있는 나무가지를 살그머니 꺼내여 흙속에 묻군 하시였다.
드디여 밥이 잦기 시작하자
정말 그날은 작식전투를 치르었던것이다.
놈들이 그렇게 날뛰는 위험한 정황속에서도 때식을 건느지 않게 제때에 밥을 짓는것은 녀대원들의 또 하나의 전투임무였다.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