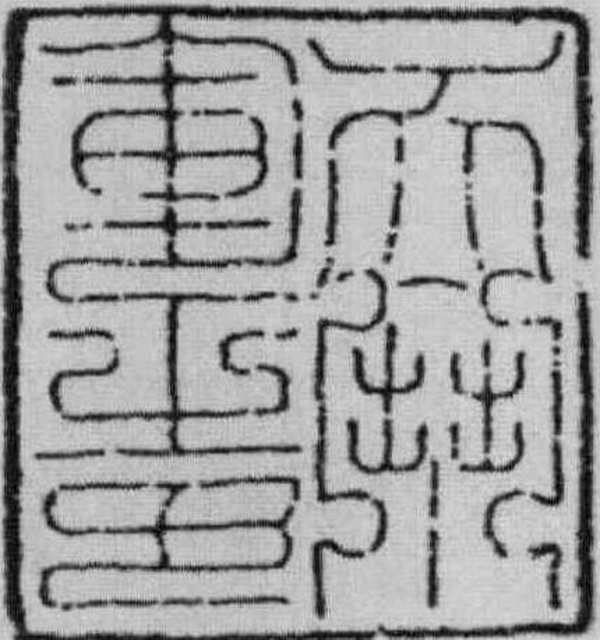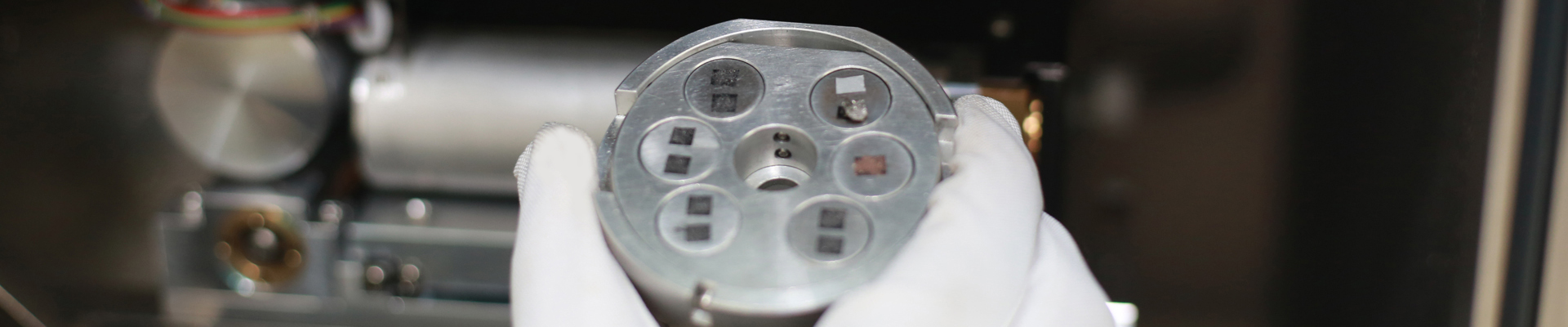
《교육, 과학,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들에서는 민족고전에 대한 연구와 번역출판을 잘하고 력사상식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력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선전을 널리 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력사유적과 유물을 귀중히 여기고 애호관리하며 민족의 넋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장은 문자나 그림을 청동이나 옥, 상아, 금, 은, 동, 나무와 같은 재료에 주조, 뚫음, 새김 등의 수법으로 반대로 새겨서 종이나 천, 진흙 등에 찍는 물건이다.
지난날 인장은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였고 또 력사의 증거물로서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력사의 각이한 시대들에 만들어져 쓰인 인장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계급관계와 사회경제생활, 문자생활 등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력사사료에 의하면 인장은 이미 고대조선에서 사용되였다.
《(남해왕) 16년(A.D.19) 봄 2월에 북명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도장을 얻어서 드리였다.》(《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제1 남해차차웅)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고대시기 조선에서의 인장사용정형을 말해준다.
고대시기부터 사용된 인장은 중세 즉 삼국시기와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였다.
《(대무신왕) 4년(A.D.29) 겨울 12월에 왕이 리물림에 이르러서 묵는데 밤에 쇠소리가 들리였다. 밝을 무렵에 사람을 시켜 그곳을 수색하여 금인과 병기 등을 얻었다.》, 《그(차대왕)가 이르자 어지류가 꿇어앉아 나라 옥새를 드리면서 간청하였다.》(《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 제4)는 기록들은 고구려가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로서 옥새를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금속을 재료로 하는 인장도 사용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세나라시기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고구려가 차지하는 지위와 문화발전에 준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백제에서도 인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백제시기의 인장사용정형은 력사기록으로 전해지는것이 없다.
신라에서는 6세기이후에 인장을 많이 만들어 사용하였다.
675년 전기신라에서는 동으로 인장을 주조하여 중앙의 각 부서는 물론이고 지방의 주, 군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나누어줌으로써 인장사용을 국가적으로 일반화시키였다. 이것은 신라에서의 공인의 사용정형을 보여주며 신라에서도 금속인장을 위주로 하여 사용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현재 전해지는 유물로서 황룡사터에서 나온 《륙공사가지인(六公祀家之印)》(그림 1) 등을 들수 있다.
발해와 후기신라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인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다음의 인장(그림 2)은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에서 1961년에 발견된 《천문군지인(天門軍之印)》이다.
《천문군》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하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인장이 발견된 위치로 보아 발해왕궁을 호위하는 군사를 가리키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보면 《천문군지인》은 왕궁호위군의 인장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1922년 동경성 즉 옛 발해수도였던 상경성주변에서 《발해대왕》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는 도장이 발견되였고 1912년에 경박호의 북쪽언저리 상경에서 7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는 성랍자성에서 동으로 만든 《홀한주겸삼왕대도독지인》(忽汗州兼三王大都督)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 발견되였다는 자료들은 발해시기 왕의 호칭과 함께 공인의 사용정형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고려시기에 이르러 인장의 사용은 더욱 활발해졌다.
고려시기 인장사용정형을 보여주는 자료는 《고려사》와 《고려명신전》 등에 실려있다.
《〔경효왕(공민왕)〕 19년(1370) 5월에 … 도장꼭지를 거북의 모양으로 꾸미였고 초록색 인끈을 달았으며 도장에는 <고려국왕지인>이라고 새겼다.》(《고려사》권72 지 제26 도장)
《김부의가 아직 높은 벼슬을 지니지 못했을 때에 그의 머슴이 포전을 경작하다가 구리쇠로 만든 인장 한개를 얻었는데 <청당지인>이란 글자가 새겨져있었다. 후일에 신라의 고전을 참고한즉 <청당>이란 좌군을 가리키는 말이였는데 이때에 와서 그가 과연 좌군수로 임명되였었다.》(《고려명신전》권3 김부의전)
이러한 자료들은 삼국시기에 이어 고려시기에도 우리 나라에서 인장이 널리 사용되였음을 보여준다.
인장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형태도 변하였다.
중세 인장의 종류는 매우 많았다. 그러나 기본상 공인과 사인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공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봉건정부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다. 다시말하여 봉건국가를 대표하는 왕과 왕의 겨레붙이들, 봉건국가의 기관, 관청 등에서 사용하는 인장이 바로 공인이다.
이로부터 공인은 대체적으로 봉건국가의
중세 인장의 종류가 다양해진 실례를 임금의 인장을 놓고 설명할수 있다.
새보는 임금의 인장이란 뜻인데 《새》는 공식적인 인장의 의미로, 《보》는 임금의 인장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씌여왔다.
《새》는 옥으로 만들었기때문에 흔히 옥새라고 하였다.
새보는 임금이 신하나 백성들, 관청들에 내리던 지시를 적은 문서들에 사용하던 인장으로서 여기에는 임금의 명령지시를 적은 문서들에 사용하는 인장과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들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를 적은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왕이 왕비 또는 왕세자, 왕세손 및 그 빈을 책봉할 때에 내리던 문서들에 사용하는 인장, 과거시험때 사용하는 인장, 통신으로 보내는 문서 및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등이 속한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고려시기에는 임금의 인장으로서 《고려국왕지인》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그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임금이 쓰던 새보에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대보》(大寶), 왕비나 세자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지시문에 사용하는 《시명지보》(施命之寶), 통신으로 보내는 문서에 리용하는 《이덕보》(以德寶), 관찰사나 절도사, 방어사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는 지시문에 사용하는 《유서지보》(諭書之寶), 과거시험때에 시험지인 시권과 합격, 불합격증 홍백패에 리용하는 《과거지보》(科擧之寶), 임금의 명의로 서적을 줄 때 리용하는 《선사지기》(宣賜之記), 《선황단보》(宣貺端寶), 《동문지보》(同文之寶), 임금의 글이나 글씨 등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임금이 규장각의 관리들에게 내리는 지시문에 리용하는 《준철지보》(濬哲之寶)등이 있었다.(《증보문헌비고》권81 례고28 새인)
사인은 공인을 내놓은 나머지 인장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사인은 인면구성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따라 두가지 즉 글자를 새긴 인장과 그림을 새긴 인장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글자를 새긴 인장은 인면구성의 기초가 글자를 새긴 인장으로서 이것은 인문내용에 따라 다시 성명인과 자호인, 장서인, 문구인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인장은 또한 그 재료를 무엇으로 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금속인장과 나무인장, 돌인장, 도자기인장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뿐만아니라 인장은 구성형식에서 볼 때 다시말하여 글자를 새긴 인면의 개수에 따라서 단면인장과 량면인장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이외에도 인장은 제작방법에 따라서는 주조인, 뚫음인 등으로, 시대에 따라서는 삼국인과 고려인, 조선봉건왕조인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인장의 형태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공인인 경우에는 형태가 따로 론의되지 않고 대체로 방형으로 무게있고 정중하게 만들었지만 사인인 경우에는 형태가 중요하게 론의되였다.
처음에 사인의 형태는 방형이였는데 고려시기에 이르러 사인이 위주로 사용되면서부터는 그 형태가 둥근형, 6각형, 8각형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인장형태의 발전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인장꼭지(손잡이)이다.
고려이전시기의 인장을 놓고보면 꼭지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고리형과 직선형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고려시기부터는 고리형이나 직선형외에 원숭이, 물고기, 봉황, 룡, 청개구리, 구름무늬 등으로 된 인장이 생겨났다. 인장꼭지에 이런 동식물들을 섬세하고 조형예술적으로 형상해놓은것은 우리 인민의 높은 조각예술을 보여준다.
이전시기의 고리형이나 직선형꼭지도 고려시기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정교성과 조형성이 결합되여 발전을 가져왔다. 뿐만아니라 사람들이 인장을 끈에 매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자신을 증명할수 있게 꼭지웃쪽에 구멍을 내주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하여 인장의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하고 인장꼭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인면에는 글자를 우아하게 쓰거나 글자와 함께 간단한 장식무늬를 새겨서 그 모양을 돋보이게 하였다.
《해동력대명가필보》에 올라있는 인장탑본자료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시기 인장의 형태에는 호로병, 솥, 붓통, 화로 등의 모양을 비롯하여 갖가지 형태가 출현하였고 인면에는 글자뿐 아니라 장식무늬가 새겨졌으며 거부기나 룡을 형상한 인장꼭지가 있었는데 이런것으로 하여 인장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였다.
인장꼭지를 거부기로 형상하는것은 그 인장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바라는데로부터 시작된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조선봉건왕조시기 임금이 사용하는 옥새와 왕의 겨레붙이들이 사용하는 인장에는 대체로 거부기로 꼭지를 조각하였던것이다.
거부기는 오래 사는 동물이며 물에서도 살고 륙지에서도 산다. 그리고 거부기는 이른바 《현무》의 상징으로서 북방을 맡은 수호신으로 인정되여왔다. 그러므로 인장꼭지를 거부기로 하는것은 그것이 오래도록 보존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념원을 반영한것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장은 발생한 이래 사회의 발전과 사람들의 미학정서적요구의 장성 등으로 하여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반영하는 내용도 보다 풍부해졌으며 모양도 우아해졌다.
인장의 종류와 형태뿐 아니라 문자와 서체도 다양하였다.
중세 인장의 문자는 대체로 한자이고 민족문자도 포괄하고있다.
우리 나라 인장들가운데서 절대다수는 한문으로 기록되여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한자사용이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 인장에는 한자외에 발해문자로 된것도 있다.
발해는 고구려의 뒤를 이어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옛 고구려땅에 세워진 강력한 주권국가로서 고구려의 발전된 문화를 이어받았다. 발해에서는 고구려에서 만들어 쓰던 리두를 사용하는 과정에 독특한 발해문자를 창안하게 되였다.
발해기와에 새겨져있는 문자들은 대체로 인장을 찍은것이 많다.
인장가운데는 오목새김한 인장과 돋을새김한 인장이 있었는데 돋을새김한 인장은 오래동안 사용하는 과정에 어느한 획이 마모되거나 떨어져나가 본래의 글자모양을 제대로 정확히 나타내지 못할수 있다.
그러나 발해의 기와들에 보이는 이러한 류형의 문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해의 기와들에 새겨져있는 한자로 읽을수 없는 문자들을 통털어 한자의 오기로 볼수는 없다. 이것은 발해에는 자기의 고유한 문자가 있었다는것을 말해주며 인장의 문자로 한자외에도 발해문자가 사용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중세 우리 나라의 인장에 쓰인 서체는 전서체와 해서체, 초서체이다.
우리 나라에서 전서체 특히 소전은 인장에서 주로 장식용으로 썼는데 이것은 해당 인장의 내용을 두드러지게 살리기 위한것이 아니라 형식적측면에서 우아하고 보다 옛스러운 맛을 돋구기 위해서였다.
황룡사터에서 발굴된 《당(堂)》(그림3)이라는 인장의 서체는 해서체로 된 인장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초서는 예서의 필획을 줄여서 쓴 글씨로서 기본특징은 필획이 매우 간단하고 여러가지 모양의 한자들이 통합된것이며 점과 획을 잇달아쓰는것이다.
《세조 9년(1463)에 임금이 지시하여 <계>(啓)자를 초서로 새긴 도장을 임금이 결재한 문건에 찍는것을 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81 례고28 새인)는 자료는 초서로 씌여진 인장의 실례로 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인장은 민족의 문화생활과 그 발전로정을 보여주는 실물자료로서 중세 우리 인민의 문자생활과 우수한 문화적재능, 금속가공기술과 출판인쇄문화의 발전을 알수 있게 해준다.